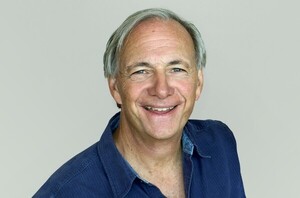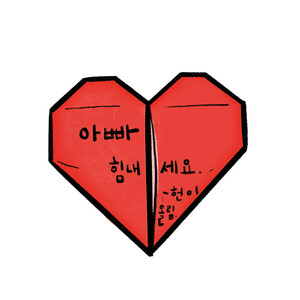![한국은행 석판 자료 이미지 [한국은행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6/207925_210281_71.jpg)
갈수록 심화되는 경기 위축에 서민경제 악화로 정부가 대대적인 서민경제 지원 대책들을 내놨다. 가계부채 탕감과 이자부담 경감은 물론 긴급 생계비 지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왔으나 정작 서민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물가관리 대책이 빠져있는 점이 아쉽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체적인 거시경제적 물가 수준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농식품 등 생필품 물가가 여전히 높아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최근 발표된 한은 보고서에서는 농산품 수입을 통해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는 데 즉각적인 농수산식품부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전체적인 물가관리를 책임지는 중앙은행과 농식품 생산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처의 이해관계가 대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는 한은의 상황 분석과 제시한 대안이 상당 부분 합리적이라고 본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으로 물가를 낮추려면 섣부른 통화정책 수단 동원보다는 수입을 통한 원활한 공급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물가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중남미 등 주요 국가가 물가관리에 실패한 교훈을 곱씹을만 하다.
지난해 경제난을 겪고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후보가 좌파 집권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를 보자.
급기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자국 화폐 대신 달러를 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미국이 금리인하를 섣불리 결정을 못하는 맥락과 연결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의 혼선으로 말기에 지나친 부동산 중과세 정책만 고집하다 반대 여론에 떠밀렸고 결국 정권을 연장하는 데 실패하고 교체됐다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 집권 당시 드러난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았는 지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잡은 듯하다. 글로벌경기 악화 때문에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측면이 있기도 하다.
세계 경제를 3년여 기간이나 고립시킨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위기와 지역분쟁으로 인한 공급망의 혼란이 초래한 후폭풍이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내로 한정해 보면 고물가와 고금리가 가장 큰 문제 거리이고 경기후퇴에 따른 기업의 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필자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안으로 소비자 물가를 낮추려는 정책적 시도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농림식품부와 공정거래워원회가 유통업계에게 잇따라 시그널을 던지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모앙새다.
우리 나라는 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경제 대국이자 선진 강대국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고 자원부존량이 적어 자국에서 생산된 물자로만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당장 생필품 물가 관리를 위해 농산품 수입장벽을 일부 완화해 해결하는 방안이 기대이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