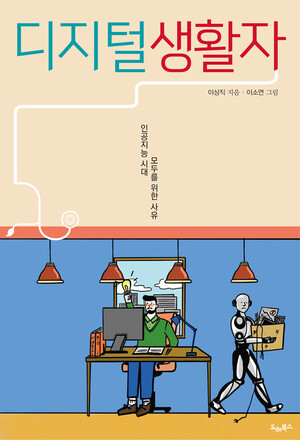작년 여름에 많은 언론사 기자분들이 독일과 아일랜드 등의 시멘트공장 취재를 다녀온 후, 수십 건의 취재 기사가 보도되고 인터넷에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국제시멘트콘크리트협회장인 ‘토마스 기요’의 발언을 인용하여 “쓰레기 시멘트 운운하는 것은 무지한 발언이며, 이미 선진 외국은 52%를 폐기물로 대체하여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를 문제 삼아 시멘트에서의 중금속 유해성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슈가 계속 공론화 되고 있다”고 한 발언만을 핵심내용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올해에도 상반기 중에 또다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시멘트 공장 취재를 떠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당연히 외국의 시멘트 산업을 돌아보고 우리의 현실을 객관성 있게 반추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영할 일이다.
혹여 여기에 편승해서 이번 해외 취재단에 우리 생존대책위원회도 참여를 허락한다면 함께 가보고 싶은 의향도 있다. 동시에 환경부나 이번 폐기물 시멘트 사안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도 함께 가면 더욱 좋겠다. 그러나 언론사 중심의 취재단이 가는 관계로 참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필자는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이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시멘트 공장 취재단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다.
첫째, 프랑스를 비롯한 이번 방문국들이 시멘트 공장에 반입해서 사용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봤으면 좋겠다. 한국은 88종의 폐기물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유럽은 몇 종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취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사 되었으면 좋겠다.
둘째, 시멘트공장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기준과 검사 방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다. 한국은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및 유해물질 기준 중 가장 민감한 염소 기준이 2%미만인데 유럽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한국은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검사를 시멘트공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유럽도 그러한지 아니면 관할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하는지도 궁금하다.
셋째,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총탄화수소로 지칭되는 THC 역시 한국은 시멘트공장이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자체 측정하는 방식으로 되어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굴뚝자동측정기(TMS) 관리 항목에 빠져있다. 유럽도 그러한지 알고 싶다. 아니면 THC를 대체할 수 있는 CO등을 TMS로 측정하고 있는지도 취재했으면 한다.
넷째,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 할 경우 지표가 되는 공기비(표준산소농도)가 한국 시멘트공장은 소성로 공기비를 13% 기준으로 보정하도록 되어있다. 유럽은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보정하는지도 소상히 알고 싶다.
다섯째, 시멘트 제품에 포함된 발암물질 6가 크롬 기준치를 한국은 20mg/Kg까지 허용해주고 있다. 프랑스는 몇 mg/Kg의 6가 크롬을 허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의 시멘트 공장은 법적으로 재활용시설(recycle)인지 아니면 폐기물 처분시설(disposal)의 한 종류인 에너지회수시설(energy recovery)인지를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번 유럽을 방문하는 취재 기자단이 실제 유럽 시멘트공장들의 운영이 어느 정도 선진화 되어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합법화되어 있는지를 국내 기준과 비교해서 면밀히 취재해주길 바란다. 또한, 지금 한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연간 250여 만 톤(유연탄 약34%대체)에 가까운 가연성 폐기물의 사용으로 인근 지역주민(동해, 제천, 단양 등)들이 사회‧환경적 문제가 심각하여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는 어떠한지? 피해를 호소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인으로서 사실 확인을 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향후 유연탄의 폐기물 대체율을 65%(500만톤)~100%(770만톤)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과연 유럽의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이처럼 많은 양의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에서 유연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가 국내 환경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많은 의문을 주고 있다.
적어도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3만3000불에 달하는 선진 대한민국에서 ‘건설의 쌀’을 생산하는 시멘트업계가 유․불리에 따라서 유럽기준을 주장하고 배제하는 그런 근시안적 행태 보다는 시멘트를 건설 자재로 활용한 최초 국가인 유럽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시멘트 산업으로 우리도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유럽 시멘트 공장 취재단 기자분들에게 상기에 부탁한 내용들을 꼭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