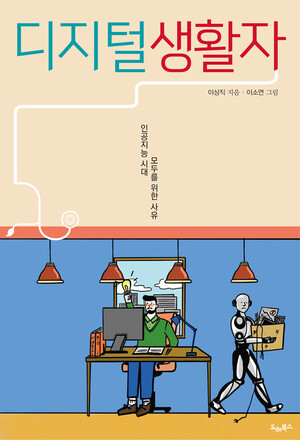2026년 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2030년 전국 확대 시행을 놓고 각 지자체마다 소각시설 신‧증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울 마포 소각장 증설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어 연일 언론에서 동 시설 확장 타당성의 찬반이 분분하다. 서울시도 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매년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놓고 처리 주체 선정이 적법한지 이해관계자들간의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산업폐기물 소각장들은 영업대상폐기물을 환경부 및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부여받은 민간 소각장이 있는 반면 이를 부여받지 못한 소각장들도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소각장들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지자체들의 타지역 생활폐기물 반입이라는 이유로 영업대상폐기물 추가를 꺼리고 있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시설에 위탁 처리했을 때 향후 이를 처리 거부하거나 과도한 처리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올 때, 소각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이유이다. 참으로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이미 33개 민간 소각장이 영업대상폐기물로 생활폐기물을 허가받아서 처리 중에 있고, 이 중에 상당수 업체는 인근 지자체들과 연간 단가계약으로 십수 년째 무리 없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해 주고 있다. 심지어 민간 소각장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가격 인상, 처리 거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관리하는 공제조합을 통해 복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미이행할 때 조합이 보증하여 책임 처리하는 시스템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귀를 닫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민간소각업계는 지자체들의 이러한 우려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은 70여개에 달하는 민간 소각시설들의 영업대상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막대한 양의 가연성폐기물이 매년 수도권매립지에 초과 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반입되고 있는 실상을 해소하고자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단 민간 소각시설들이 생활폐기물을 적법하게 반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지자체들의 설득과 지역이기주의 등을 연차적으로 풀어가면서 우려했던 단가 인상, 처리 거부 등이 기우에 불과했음을 알려주고자 한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관련 지침 문서 등을 계속 전파하면 귀를 닫고 있던 지자체들도 관내 생활폐기물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반입협력금을 내면서 까지 타지역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관내 소각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타지역에서 관내로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어 이 또한 수익을 창출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상생과 협력이라는 국가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도 절반에 가까운 산업폐기물 소각장들이 생활폐기물 허가를 취득하지 못해서 인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의뢰 또는 용역이 발주되어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하루속히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023년 12월 19일 환경부 차관 주재 환경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민간 소각시설들의 생활폐기물 처리 창구를 확대하겠다는 결정의 후속 조치가 하루 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