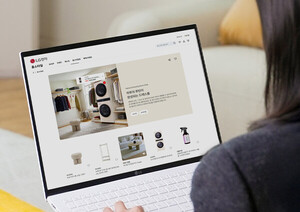"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 관세 압박 수위 끌어올린 트럼프
韓, 한미 협상 통해 '대만과 동등 수준' 조건 확보
"美, 고율 관세 실제 부과 땐 부담 커… 협상력 극대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동취재단]](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11/238337_277606_1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의 자국 귀환을 기대하며,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실상 한국, 대만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준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과거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100%를 차지했지만, 이후 대만과 한국으로 산업이 이동했다"며 "(반도체 생산지) 대부분은 대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은 기간 상당 비중의 반도체 산업이 돌아올 것"이라며 "그들이 관세를 내기 원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관세는 매우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관세를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로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며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통해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내년 중반 전까지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 지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H-1B 비자 노동자의 필요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은 아직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외국 기술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1년 안에 미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인력을 다시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산업 기반을 해외에 넘겼던 과거를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대부분이 대만에서 생산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만 TSMC가 파운드리 1위 업체인 것은 맞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2위이자 2024년 기준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특히 AI 반도체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직원이 반도체 클린룸에서 웨이퍼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SK하이닉스]](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11/238337_277608_134.jpg)
한국 정부는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 기간 열린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반도체 관세 조건을 확보했다. 양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공동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앞으로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정부는 이를 "미국이 대만에 적용할 관세 수준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유럽 연합(EU)과 일본이 각각 '최대 15%', '최혜국 대우'를 명문화한 것과 달리 한국에는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EU·일본은 선단 공정 경쟁력이 미미하고 차량용·산업용 레거시 공정 비중이 높아, 데이터 센터와 모바일 중심의 선단 공정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대만과 경쟁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수요 폭증으로 전 세계 자본·물자가 반도체와 관련 산업에 집중되는 가운데 자동차(15%), 철강(50%)처럼 높은 관세를 반도체 등에 적용할 경우 미국 내부 투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반도체 고율 관세 시사는 한국, 대만 사이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