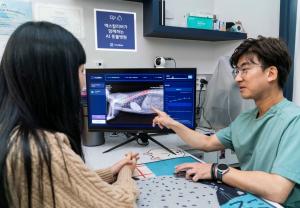인공지능(AI)을 이용한 그림은 물론 작곡, 작사 등 다양한 저작과 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영국 서리 대학교 라이언 애봇 박사팀은 AI시스템 ‘다부스’를 이용한 발명으로 두 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출원인은 다부스 개발자인 스티븐 탈러였다. 프랙털 구조를 이용해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음식 용기와 신경동작 패턴을 모방해 수색구조 작업을 할 때 눈에 잘 띄도록 만든 램프다. 발명은 전적으로 AI시스템 다부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고, 다부스를 만들고 소유한 스티븐 탈러 자신에게 특허권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 특허는 대부분 국가에서 사람이 아닌 AI가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는 특허 실무 또는 학문적으로 재미있는 주제다. 그러나 발명조차 AI가 사람을 대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디지털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창작자에겐 치명적인 위협이다. 근로자 임금이 증가하면 기업은 기술로 노동을 대체한다. AI는 인간의 일자리와 노동을 더욱 쉽게 대체할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 AI가 인간의 일자리, 노동을 뺏을수록 탁월한 결과물이 나올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일까.
인간이 가진 장점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뭘까. 창의, 근면, 끈기, 노력 등 다양한 것이 있다. 누군가 필자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일을 나누고 동료의 부족한 점을 찾아 채워주는 분업과 협업을 들고 싶다. 인류가 공동체를 만들고 가꾸어온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가 꿈꾸는 디지털시대가 인간의 모든 일을 AI에게 맡기는 세상이 되어야 할까.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인간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결과물도 있다. AI라고 완벽할 수만 없는 이유다. 인간의 부족한 점을 AI가 채우고 AI가 부족한 점을 인간이 채운다면 어떨까. 결과를 떠나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은가. AI 위험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픽셀스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311/174230_150386_1056.jpg)
예를 들어보자. 홍희령, 황해연 작가는 ‘선택된 무책임’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가들은 AI와 함께 학습한다. AI는 작가들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이미지들을 만든다. 작가들 역시 AI의 결과물을 통해 창작 방향을 학습한다. 인간과 AI의 예술적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과 발전이다. 인간과 AI의 상호 학습 속에서 작가들의 기존 작품은 새로운 작품에 자양분으로 승화한다. 홍희령 작가의 작품을 보자. 어린이들이 각자의 눈과 손으로 작가의 얼굴을 다양하게 그린다. 그렇게 그려진 작가의 얼굴들은 AI가 작가의 기존 작품을 참고하여 변환하고 3D 프린트를 통해 제작된다. 황해연 작가의 작품을 보자. 대자연의 빙하는 생명 탄생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거대한 빙하가 빨리 녹아내리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자연 생태계의 순환이 중단되고 모든 생명이 위기를 맞는다. AI는 작가의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얼음물고기 작품으로 새롭게 우려낸다. 인간과 AI의 진정한 협업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필자는 전시 서문으로 그 의미에 동참했다.
“대자연의 빙하가 깊은 숨을 모으고 끝내 하얀 포말로 무너진다. 생명의 근원은 인류 문명 앞에 백색 경계로 찢어지고 유리벽처럼 꺾여 낙하를 거듭한다. 칠흑의 경계 밖에서 떨림을 숨기고 AI가 그 순간을 기다린 듯 손을 내밀어 세상에 펼친다. 아이들의 순수함은 인간의 근원이고 미래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위탁된 작가의 얼굴은 놀이터다.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산뜻한 긴박감에 빠진다. 아이들은 놀다 떠나고 그 공간을 AI가 개입하여 또 다른 얼굴을 뽑아낸다. 그 얼굴은 작가의 얼굴일까. 작가들은 AI 앞에 창작의 주체이자 객체이며 주도면밀한 설계자이자 방관자다. 인간 창작의 세계에 AI가 비집고 다가섰다. 예술의 진보가 그러했듯 AI는 붓과 조각칼이 되어 작가의 얼굴과 이름과 스튜디오를 훔친다. 디지털 공간에 흩어진 작가의 데이터를 씨줄, 날줄로 엮어 변증법적 합일에 이르기를 반복한다. 깊은 바다속 단단한 무리를 이룬 유리 얼음의 상흔과 아이들이 남긴 도화지를 벗어나 '또 다름'으로 우뚝 섰다. 인간의 틈에서 AI가 나오고 AI의 틈에서 다시 인간이 나온다. AI에게 손을 내민 작가들에게 AI는 어떻게 화답할까. 작가들의 혁신은 AI를 디딤돌 삼아 창작의 신세계로 관객을 인도한다.”
AI는 인간을 대체하고 파괴하는 기술이 되어선 안된다. 그것은 공들여 쌓아올린 인류공동체의 자살행위다. 인간과 AI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만이 인류의 미래가 대자연의 빙하처럼 꺾여 녹아내리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다.
/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장
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사무국 재정과장
전 (주)KT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및 AI 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저서 :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혁신과 공존의 신세계 디지털”, “우리 엄마 착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